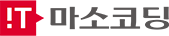최근 기업용 솔루션 시장의 화두는 단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변혁)’이다. 전통적인 제조업에서부터 IT 기업을 막론하고, 디지털을 기반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혁신에는 대가가 따른다. 기업이 직면하는 첫 번째 허들은 ‘비용'이다. 모든 기업 최고경영자(CEO)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성장을 추구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실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현상유지에 급급한 대부분의 기업은 혁신에 투자할 비용을 어디에서 마련할 지 막막한 상황이다.
리미니스트리트는 바로 이 점에 주목했다. 데이터베이스(DB), 전사적자원관리(ERP) 등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는 매년 유지하는 데만도 막대한 비용이 든다. 수년간 안정화를 거쳤다 싶으면 새로운 버전이 나와 또 비용부담으로 이어진다. IT 부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지만, 기업 인프라와 다름없는 소프트웨어를 소홀히 할 수도 없다.

그는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할 때 얼마나 오래 탈지는 고객이 결정한다. 수리를 하더라도 차량을 본사에 맡길지, 정비소에 맡길지는 어디까지나 고객의 선택이다. 하지만,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시장은 그렇지 않다. 운영 규모나 방식을 벤더가 결정하고, 새로운 릴리즈가 나오면 업데이트를 강요한다. 고객이 비즈니스를 주도하는 그림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벤더사의 ‘폭리'다. 세스 CEO는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는 비싸고, 설치와 최적화에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이 모든 과정이 곧 비용이다.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용의 마진율은 90%를 넘는다. 어떤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90% 이상의 마진율을 가진 업계는 어디에도 없다. 이들이 이렇게 높은 마진율을 구가할 수 있는 건 경쟁이 부재한 탓이다"라고 지적했다.
리미니스트리트는 오라클, SAP, IBM, MS 등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다. 기본적으로 모든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는 벤더사의 몫이지만, 벤더 기본 정책보다 훨씬 저렴하게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리미니스트리트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일종의 써드파티 유지보수 전문 업체인 셈이다.
한국에는 2016년 8월 진출했다. 대표적인 고객사 중 한 곳으로 서울반도체가 있다. 서울반도체는 SAP의 ERP를 도입해 운영 중이었는데, 리미니스트리트에 유지보수를 맡기면서 기존에 발생했던 연간 유지보수 비용을 50% 이상 절감할 수 있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세스 CEO는 "모든 CEO가 성장을 추구하지만, 현실은 IT 예산의 대부분을 데이터센터 운영,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 유지보수 등 현상유지에 쏟아붓기에 급급하다. 리미니스트리트는 전체 IT 예산의 90%를 유지보수에 쓰는 기업이 이를 60%로 낮출 수 있도록 해준다. 기업은 이렇게 생긴 40%의 여력을 혁신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고작 10%만 혁신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과 비교하면 누가 경쟁 우위에 설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김형욱 리미니스트리트 한국지사장도 "국내서 많은 최고정보책임자(CIO)를 만나보니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유지보수에 너무 많은 비용을 쓰고 있지만, 정작 비용 대비 서비스 가치는 낮다는 반응을 많이 접했다"며 "리미니스트리트는 IT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혁신에 재투자하고 싶다는 CIO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