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웨이 역시 보유 특허 수가 삼성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미국과 중국 법정에 삼성을 불러 세웠다. 그 많은 특허를 갖고도 매번 당하기만 하는 삼성전자. 왜일까? 삼성의 특허가 강력하지 못해서다. 같은 특허라도 강한 특허가 있고, 약한 특허가 있다. 이제 양 떼기 특허로는 글로벌 IP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
◆ 특허, '보호'해줘야 강해진다
우리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액은 한 해 19조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으로 보면 4%가 넘는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R&D 상품화 비율은 세계 최저다. 노벨상 배출도로 보면 더욱 한심하다. 그만큼 대한민국 특허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다.
정부와 일부 과학자는 우리의 기술 수준이 낮기 때문에 우수특허, 강한 특허가 탄생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항변한다. 이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애플의 '밀어서 잠금 해제'나 '모서리가 둥근 스마트폰 디자인'은 얼마나 대단한 최첨단 기술이기에 삼성전자를 그리 괴롭혔을까.
특허는 기발한 기술에 의해 우수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국가 시스템적 '보호'에 의해서도 강력해질 수 있다. 대한민국의 특허 보호 시스템은 자국민의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 자유경제주의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서 시작된다. 우리의 지식재산권이 다른 사람도 아닌 국가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침해당한다면 이는 자유경제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소송 시 중소기업의 패소율이 지나치게 높은 문제 역시 특허 보호를 위해 해결할 과제 중 하나다. 2009~2013년 5년간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싸운 특허소송에서 중소기업의 패소율은 90%에 달한다. 항소 사건에선 100% 졌다. 몇 해 전만 해도 대기업 직원 교육 동영상에 '중소기업 특허는 무조건 다 죽일 수 있다'는 내용이 버젓이 실렸던 게 한국의 현주소다. 최근 휴대폰 비상호출 기술을 두고 15년째 이어진 대기업(LG유플러스)과 중소기업(서오텔레콤) 간 특허분쟁에서도 법원이 대기업인 LG유플러스 손을 들어줬다.
기술의 진화는 인간의 창조의욕에서 비롯된다. 이 같은 욕구는 합당한 보상으로 북돋워진다. 하지만 우리의 IP 보호·보상 시스템은 너무 취약하다.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한국의 IP 보호 수준은 전체 114개국 가운데 68위였다. 국제경영개발원(IMD)도 우리의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를 27위로 매겼다. 한국의 경제 규모나 국가 경쟁력 대비 매우 뒤떨어진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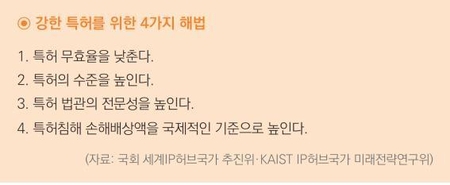
특허심판원에 의해 무효가 되는 특허는 전체 심결의 절반쯤이다. 특허 침해자가 침해가 아니라며 제기한 특허 무효심 덕에 상대편 특허의 절반쯤이 백지가 되는 꼴이다. '특허가 무효'라는 것은 침해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는 논리다. 특허침해 소송을 당했을 경우 반격용으로 가장 흔하게 제기하는 법적 조치가 바로 '특허무효심판'이다.
특허청이 소정의 심사를 거쳐 공식 인정해준 특허가 왜 이리도 무력할까. 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특허청 특허심사관의 숫자도 한몫한다. 우리나라 심사관이 처리하는 건수는 1인당 연간 230건이다. 유럽의 5배에 달하는 가혹한 물량을 해결한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특허 1건을 심사하는데 들이는 시간은 평균 8.7시간이다. 이렇듯 초능력자를 요구하는 현실에서 심사관이 모든 건의 특허심사에 심혈을 기울이기는 불가능하다. 특허심판원의 무효율이 50%쯤인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심사관 1인당 담당하는 기술 범위도 현격한 차이가 난다. 미국의 심사관이 평균 9개 분야를 심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 10배에 달하는 87개 기술분야를 다룬다. 한국 특허심사관이 박사급 이상의 높은 수준을 자랑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분야를 다뤄야 하는 점은 심사 전문성 하락과 직결된 문제다.
무효 가능성이 절반인 허약한 특허에 과연 누가 투자할 수 있을까. 특허 안정성이 높아야 투자도 유치하고 그 특허를 담보로 IP금융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우리와 비슷하게 특허 무효율이 높던 일본이 심사관을 대폭 증원해 무효율을 18%까지 줄인 점은 주목할만하다.

특허재판에 대한 후진성도 강한 특허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다. 한국 법관은 특허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 특허소송 1심의 경우 전국 58개 법원에서 산발 진행된 데다, 판사는 기껏해야 2~3년간 특허를 다루고는 다른 재판부로 옮겨간다.
최근 특허소송 관할집중법이 통과되면서 특허전문 법관이 자리 잡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결국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한다. 먼저 특허 판사가 짧은 시간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술 심리관이나 전문가 증인, 이를 응용한 해외 사례를 연구해 법관의 전문성을 보완해야 한다. 이것이 이미 고착화·적폐화 된 현행 사법 시스템 개혁을 바라는 것보다 현실적이다.
※ 외부필자의 원고는 IT조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경동 위원은 전자신문 기자와 지식재산 전문 매체 IP노믹스의 편집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국내 최대 특허정보서비스 업체인 ㈜윕스에서 전문위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IP정보검색사와 IP정보분석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특허청 특허행정 모니터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특허토커'와 'ICT코리아 30년, 감동의 순간', 'ICT시사상식 2015' 등이 있습니다. '특허시장의 마법사들'(가제) 출간도 준비 중입니다. 미디어와 집필·강연 활동 등을 통한 대한민국 IP대중화 공헌을 인정받아, 올해 3월에는 세계적인 특허전문 저널인 영국 IAM이 선정한 '세계 IP전략가 300인'(IAM Strategy 300:The World's Leading IP Strategists 2017)에 꼽히기도 했습니다.
- [유경동의 특허토커] IoT 보안 강자 '퍼프'
- [유경동의 특허토커] IP명가의 정석, 지멘스
- [유경동의 특허토커] 반도체 M&A 시장의 막후, 특허
- [유경동의 특허토커] 대체불가, 日 키엔스
- [유경동의 특허토커] 어쩌다 구글은 '안티 특허'가 됐을까?
- [유경동의 특허토커] 빅테크 주가, '특허'는 알고 있다
- [유경동의 특허토커] 특허로 본 자율주행의 미래
- [유경동의 특허토커] IP명가의 품격, IBM
- [유경동의 특허토커] 3M의 3無
- [유경동의 특허토커] 특허로 본 코로나19
- [유경동의 특허토커] 특허를 보면 ‘사람’이 보인다
- [유경동의 특허토커] 만년 2등의 반란, 펩시
- [유경동의 특허토커] '특허를 바른 기업' 존슨앤존슨
- [유경동의 특허토커] 특허로 본 CES 2020
- [유경동의 특허토커] 비약의 BYD
- [유경동의 특허토커]변칙왕, 테슬라
- [유경동의 특허토커] 다이슨 '전동칫솔', 커밍순!
- [유경동의 특허토커]담배시장의 애플, 필립모리스
- [유경동의 특허토커]월마트 특허에 담긴 ‘유통 미래'
- [유경동의 특허토커] 181살 P&G의 변신
- [유경동의 특허토커] 페북코인 플랫폼은 ‘페북 메신저’: 특허로 본 리브라 프로젝트
- [유경동의 특허토커] 디즈니 특허 : 꿈을 현실로, 상상을 제품으로
- [유경동의 특허토커] 특허검색, 무작정 따라하기 : ‘아이코스’ 사례를 중심으로
- [유경동의 특허토커] 오보에 대처하는 특허의 자세
- [유경동의 특허토커] MWC·CES 숨은 특허찾기
- [유경동의 특허토커] 우리 삼성이 달라졌어요
- [유경동의 특허토커] 넷플릭스 글로벌 전략? ‘특허’한테 물어봐!
- [유경동의 특허토커] 쿠팡 투자 전말, 특허는 알고 있다
- [유경동의 특허토커] 꺼진 불도 다시 보게 하는 '특허'
- [유경동의 특허토커] 무료 특허DB, 제대로 써먹기
- [유경동의 특허토커] 특허王 삼성의 속살
- [유경동의 특허토커] 특허 DB 검색의 진화
- [유경동의 특허토커] 특허, 신문고를 울리다
- [유경동의 특허토커] 특허거래정보가 들려주는 비밀
- [유경동의 특허토커] 특허, 세상에 말을 걸다
- [유경동의 특허토커] NPE를 보는 두가지 시선
- [유경동의 특허토커] 기업 보유 특허도 순위 정하고 평가하면 '돈' 된다
- [유경동의 특허토커] 팻스냅 거들떠보기
- [유경동의 특허토커] 특허와 대통령
- [유경동의 특허토커] 특허와 여배우
- [유경동의 특허토커] 구글, KT 특허를 탐하다
- [유경동의 특허토커] 삼성 vs 화웨이, 임박한 세기의 대결
- [유경동의 특허토커] 특허를 보면, 미래가 ‘정말’ 보일까
- [유경동의 특허토커] 특허로 본 아이폰X
- [유경동의 특허토커] 상표의 반란
- [유경동의 특허토커] 드론, 특허를 띄우다
- [유경동의 특허토커] 이상한 나라의 특허청
- [유경동의 특허토커] 특허, 삼성 기밀을 탐하다
- [유경동의 특허토커] 발칙한 특허 'OPIS'
- [유경동의 특허토커] 스마트폰 한 대에 수백개 특허가 필요한데, 후순위가 된 지식재산권
- [유경동의 특허토커] AI 음성비서 시대, 특허로 대비하라

